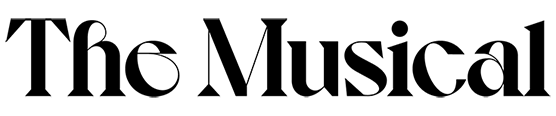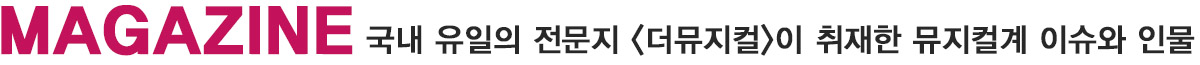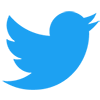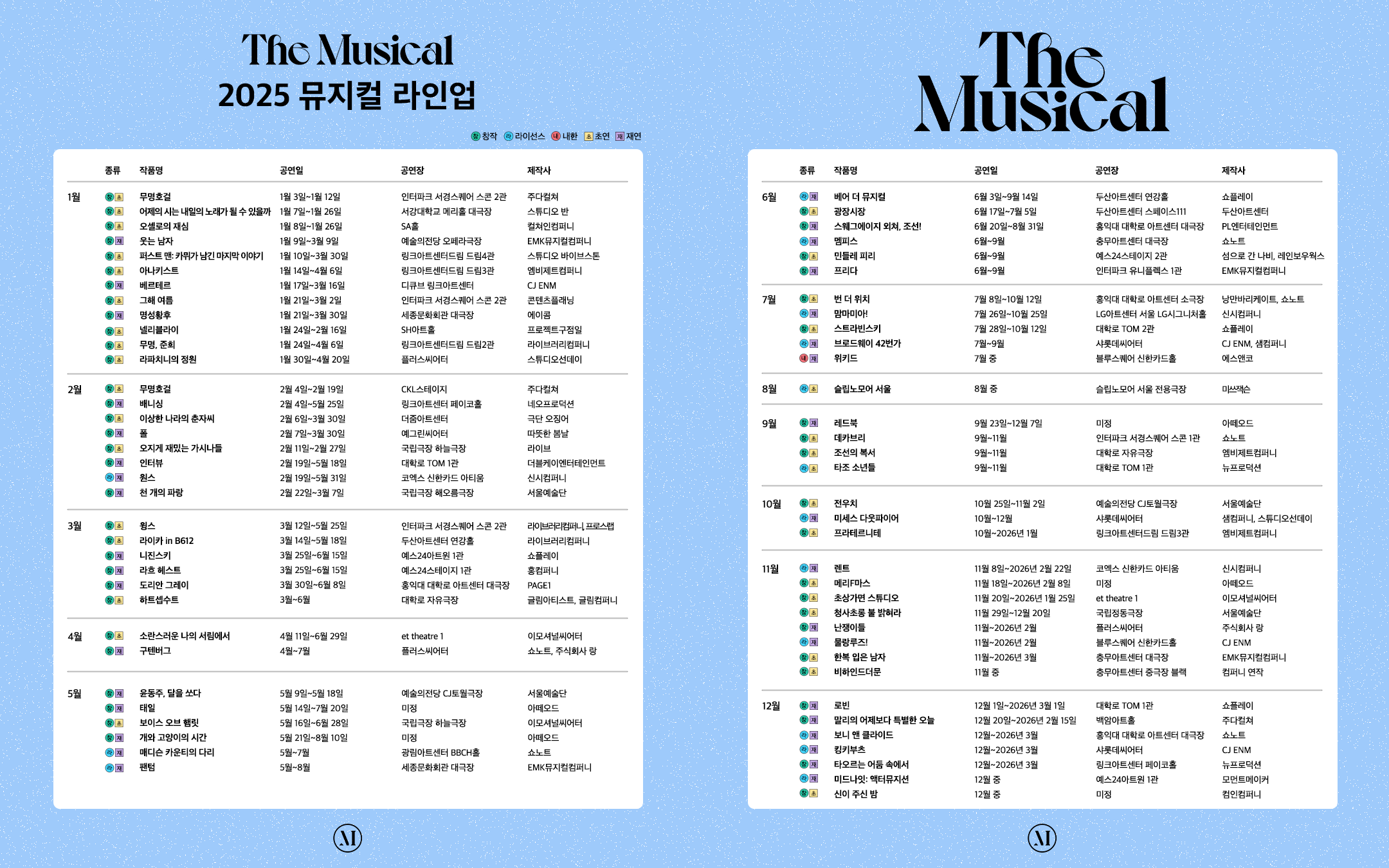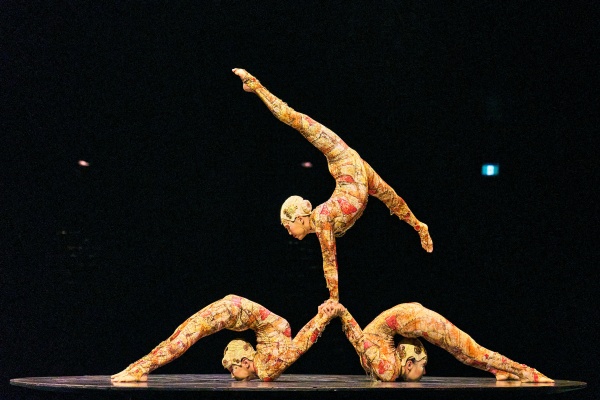2007년 개봉한 동명 영화를 바탕으로 하는 뮤지컬 <원스>는 기타리스트 가이, 이민자 걸의 만남을 통해 꿈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지난 2014년 국내 초연 이후 약 1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다. 다시 돌아와 반가운 또 다른 존재가 있으니, 바로 황석희 번역가다. 영화 번역에 이어 이번 뮤지컬 <원스>의 두 번째 시즌 번역을 맡은 그는 번역 작업 중 “장발 하고 밴드 활동을 하던 때”가 떠올랐다며 웃음 지었다. 2019년 <썸씽로튼>을 시작으로 어느덧 10편의 공연을 번역한 20년 차 번역가, 황석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음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번 <원스> 작업이 한층 더 반가우셨겠네요.
20대 때 10년 가까이 밴드 활동을 했어요. 4~5년은 포크 음악을, 이후에는 록 음악을 했었죠. 워낙 포크 음악을 좋아해서 그 정서가 익숙하고 편해요. 그래서 포크 음악이 기반이 되는 <원스> 번역을 할 때도 확실히 그때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요. 넘버 번역을 하면서 직접 기타도 쳐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심지어는 넘버 가이드를 녹음해서 드린 적도 있어요. 아이리쉬 포크는 말하듯이 노래하는 게 특징이라서 음표와 가사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직접 들려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번역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요. (웃음) 음악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버린 길’인데, 이렇게 지금의 일을 하며 다시 만나니까 감회가 남달랐어요. 특히 아내가 굉장히 좋아해서 기쁘더라고요. 아내는 밴드 활동을 하던 때의 제 모습을 아는 사람이어서 요즘 일에 치여 사는 저를 불쌍하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는 제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나 보더라고요.
<원스>는 ‘Falling Slowly’라는 대표곡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모두가 아는 곡을 번역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나요.
번역 작업이 힘들긴 했어요. 상징적인 가사들이 많아서, 일대일로 직역을 하려니 맞아떨어지는 가사를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Falling Slowly’는 보통 제가 추구하는 번역 방식과 달리 원문을 토막내고 해체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이 길었어요. 아일랜드는 섬나라이다 보니 노래에 바다, 배에 대한 메타포가 많아요. 이 노래 역시 늦지 않았으니, 배에 올라타서, 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뉘앙스가 담겨 있고요. 가이가 걸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잘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작품을 번역할 때 번역가의 생각이 덧붙여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번역 작업을 할 때 작품에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번역가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원문과 캐릭터를 해체하고 재구축해서 서사를 만들어 가는 분들도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원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캐릭터, 대사, 비유를 관객에게 최대한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제게 있다고 생각해요. <틱틱붐>을 예로 들자면, 조나단 라슨은 서른을 앞둔 주인공 존의 상황을 1라운드가 종료되기까지 7초 정도 남은 스포츠 경기라고 비유해요. 그럼 저는 번역가로서 조나단 라슨이 이 상황을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로 썼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재창작보다는, 원작자의 보이스를 충실하게 옮기는 걸 1차 목표로 합니다.

<원스>는 웃음 포인트가 꽤 많은 작품이죠. 문화마다 유머 코드가 다르다 보니 이를 옮기는 데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유머 코드를 번역하는 건 늘 어려워요. 특히 영국 유머가 진짜… 재미없거든요. (웃음) 시니컬한 면도 많고요. 저는 대본에 있는 유머 코드는 최대한 살리려고 해요. 처음 이 작품을 제안 받았을 때, <틱틱붐>을 함께했던 이지영 연출가님이 작품에 웃을 구석이 적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을 읽어 봤는데, 의외로 유머가 되게 많더라고요. 대본에 10개 정도의 유머가 있을 때 그걸 번역해서 6~7개 정도만 관객에게 납득시켜도 번역가로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 이런 유머 코드를 잘 살리는 데 집착하는 편이에요. (웃음)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런지 초연과 재연을 모두 본 관객분들이 재연에 유머가 더 많아졌다고, 황석희 번역가가 추가한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넣은 유머는 거의 없습니다.
영화와 공연 번역의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공연은 번역 과정에서 창작진, 배우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겠죠. 그러한 지점에서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틱틱붐> 넘버를 번역하던 때였는데, 넘버 노트가 하나 남은 상황에서 이 음을 뭘로 채워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배우들이 가사를 제안했는데, 그 가사가 의미상으로는 좋았지만 부르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르기 어색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장지후 배우가 ‘어색한 걸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우리 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웃음) 영화 번역은 혼자 하는 작업이잖아요. 저 혼자 어떻게든 만들어서 관객을 납득시켜야 해요. 그런데 공연 번역에서는 제가 원문이 품고 있는 의도를 80% 정도 채우면, 나머지 20%를 배우들이 노래와 연기로 채우기도 하고, 연출가가 연출로 채우기도 하고, 안무가가 동선으로 채우기도 해요. 혼자서 모든 텍스트의 설득력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누군가 나의 허점을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이 제게는 신기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공연 번역은 지금까지의 작업보다 훨씬 덜 외로운 작업이에요.
20년차 영화 번역가이지만, 공연 번역은 이제 막 열 작품에 접어들었잖아요. 공연 작업을 함께하며 번역가로서 성장했다고 느끼는 점이 있나요.
늘 많이 배워요. 번역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는 경험이 적은 분야인데, 공연 번역은 늘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하니까 새로워요. 사실 <틱틱붐> 전까지는 작품에 나서서 개입하지 않았어요.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개입해도 될지 모르겠어서요. 그런데 <틱틱붐>을 이지영 연출가님과 함께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연출가님이랑 동갑이어서 편하게 작업하기도 했고, 연출가님이 저를 끌어 주시니까 ‘내가 이 선까지 다가가도 되는 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작품에 도움이 되는 구나’ 싶더라고요. 이번이 이지영 연출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작품인데, 덕분에 연습 과정에서 지레 겁먹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선에 대해 감을 잡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