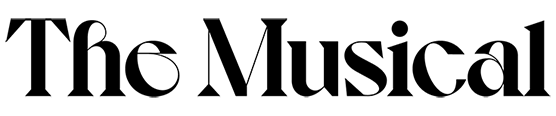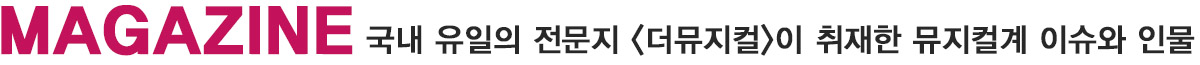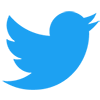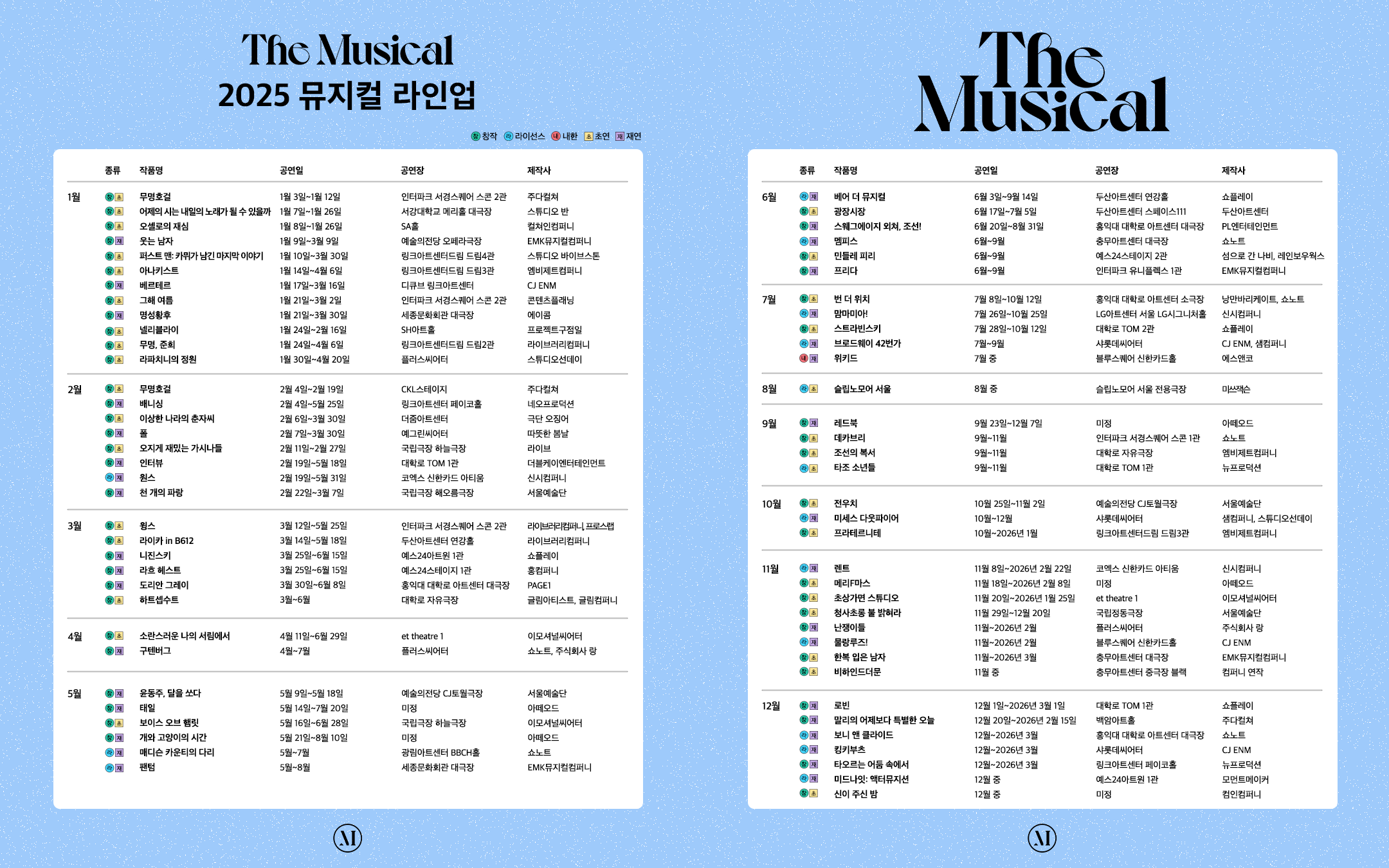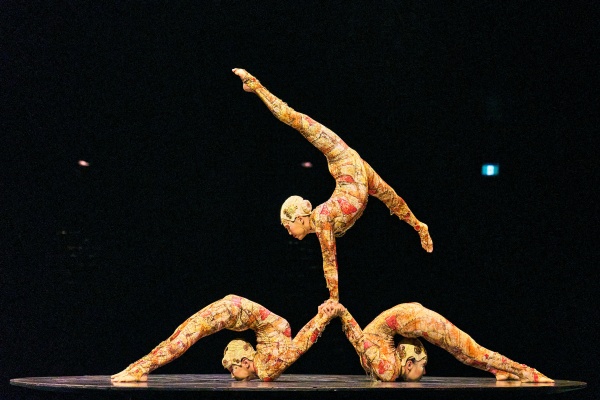지난 10월 30일,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박천휴와 윌 애런슨의 <어쩌면 해피엔딩> 여섯 번째 시즌(손지은 연출)이 시작됐다. <메이비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 이후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공연 중인 이번 프로덕션은, 처음 접하는 관객들뿐 아니라 기존 팬들에게도 새롭게 와 닿을 만하다. 서사와 넘버, 동선 등이 대부분 그대로지만 무대와 디테일에서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 우란문화재단의 리딩과 트라이아웃 이후 10주년을 맞이한 레퍼토리로서 한층 견고해진 완성도를 보인다.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무대
이번 프로덕션은 특히 시각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게 한다. 이전의 대명문화공장 비발디파크홀과 예스24스테이지 1관이 400석 정도의 소극장이었던 반면,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은 620석의 중극장이다. 이에 따른 무대의 확장이 재치 있게 이루어졌다. 양쪽에 올리버와 클레어의 방문이 위치하는 등의 기본적인 구조는 같으나, 후면을 벽으로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틔워 놓았다. 2층을 없애고 무대를 넓게 사용하는 모습이다.
그러한 가운데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전보다 보강된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올리버와 클레어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거나 반딧불로 가득한 숲속에 들어서는 장면 등에서 배경과 상황을 묘사할 뿐 아니라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한다. 나아가 음악과 상호작용하며 인물들의 감정선을 섬세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둘이 ‘사랑이란’을 부를 때 상승하는 멜로디에 맞춰 확장되는 아치형의 빛은 고조되는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인물들이 탑승하는 자동차가 첨단 기술을 떠올리게 하는 등 장면의 곳곳이 미래 도시의 면모를 엿보게 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곡선을 주조로 한 무대디자인이 작품의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살린다. 겹겹의 아치형 프레임은 시간의 깊이와 기억의 층위를 연상시킨다. 또한 모서리가 둥글게 마무리된 가구들, LP판, 낡은 책 같은 소품들과 어우러지며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
영상 또한 차갑기보다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톤을 담고 있다. ‘기억을 지우기’에서는 두 휴머노이드의 내면을 디지털적이면서도 동화적인 느낌으로 묘사하며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

더욱 섬세해진 어쿠스틱 사운드
무대 공간의 변화 속에서 6인조 오케스트라의 어쿠스틱한 음색도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 든다. 그중에서도 현악기 소리는 이 공연이 심장을 관통하고 피부를 시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반딧불 쫓기’, ‘첫 입맞춤’, ‘기억을 지우기’ 같은 연주곡들에서 미묘하게 떨리는 비브라토의 음들은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이처럼 중간중간 연주와 움직임을 통해 관계와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가 하면, ‘반딧불에게’에서 미끄러지듯 음계를 오르내리는 글리산도는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복잡한 정서와 공명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브로드웨이 버전에서처럼 스트링으로 화음을 하나씩 튕기는 아르페지오로 정교함을 더했다. 이 곡은 사랑 노래인 동시에 반짝이는 작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 짧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운 두 달”을 살아가는 반딧불은 올리버와 클레어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이 뮤지컬의 음악은 장식적이지 않으면서도 강렬한 감응을 불러온다. 마치 형용사 없이 매끈하게 잘 써진 글을 읽는 것 같다. 그런 만큼 미묘한 뉘앙스와 톤이 매우 중요하다. 주소연 음악감독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종지 부분의 마지막 음이 사라지는 순간까지의 음색을 조정하는 세밀한 작업을 강조했다. 이처럼 공들여 템포와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은, 6연임에도 여전히 생생한 연주를 만날 수 있게 한다.

사랑이라는 위반을 통해 다다른 곳
무대의 변화와 함께 악기의 배치와 배우들의 동선도 조금 달라졌다. 올리버가 제임스의 유품인 앨범을 들고 그를 그리워할 때, 제임스가 등장하여 피아노 솔로를 연주한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그를 위해 무대 뒤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던 피아노가 사라졌다. 대신 음악감독이 공연 내내 연주하는 오른쪽 객석 근처의 피아노에서 장면이 진행된다. 연기 공간과 연주 공간을 넘나드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그 외에도 등·퇴장 동선이나 움직이는 타이밍 등의 디테일한 수정으로 유기적인 완성도를 높인 모습이다.
이번 프로덕션은 초연 배우들과 새롭게 참여하는 배우들이 다양한 페어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필자가 관람한 회차의 신성민과 박지연은 절묘한 호흡으로 눈물과 웃음을 쉴 새 없이 자아냈다. 또한 세상의 끝에 내몰린 채 사랑을 알아가는 헬퍼봇들의 설렘과 슬픔을 진정성 있게 연기하며 공감대를 이끌었다.
사랑이 프로그래밍되어 있지 않은 것이 로봇뿐이겠는가. 인간에게도 사랑은 언제나 ‘위반’의 행위다. 우주의 비밀과 같은 고통스러운 열정을 알게 하는…. 두 로봇은 금지된 여행과 운전을 감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이 사랑으로 인해 다다른 곳은 바로 반복과 새로움, 기억과 상실의 그 어딘가이다. 이는 듀크 엘링턴의 재즈처럼 끊임없이 변주되는 영원회귀의 시공간이며, 같은 고통을 다시 감내하게 하는 어쩌면 해피엔딩의 과정이다.